검색결과 리스트
글
히말라야 / 등정이 아닌 히말라야 관광
제목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히말라야라고 했지만 정작 이 영화, 산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이석훈 감독의 ‘히말라야’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은숙 감독의 ‘빙우’(2003)이래 12년 만에 만들어진 산악영화다.
산약영화는 헐리웃에서는 액션과 스릴러의 한 장르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영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분야다. 그만큼 고난도의 연출과 촬영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면을 의식했는지 ‘히말라야’는 스릴보다는 휴면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관건은 드라마로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해 이 영화는 스릴은 포기하고 휴먼은 어설픈 범봉(凡峰)이 되고 말았다.
왜 오르는가?
누군가는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했고 나에게 물었더라면 ‘내려오기 위해서’라고 답변했겠지만 결국은 산이 더 편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더구나 산에 오름으로써 다소의 생활비라도 생긴다면.
영화는 산쟁이들의 영원한 화두를 던지지만 등산 철학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간간이 섞은 한국영화 특유의 썰렁한 유머 코드는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8천 미터 높이의 봉우리가 아님을 가리킨다.
등반의 목적이 불분명하던 영화는 엄홍길 대장(황정민)이 하산 도중 목숨을 잃은 후배 산악인인 무택(정우)과 정복(김인권)의 시신을 찾으러 에베레스트를 찾음으로써 분명해진다.
문제는 웃음 대신 울음을 주어야 할 이 지점부터 미쳐 관객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영화 스스로가 등산과 하산을 반복하다가 어느 새 엔딩 크레딧을 맞는다는 점이다.
우리영화에서 산악영화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히말라야’는 영화의 목적이 아닌 엄흥길 대장이 14좌를 오르는 부분을 빼고 처음부터 등정도 돈벌이도 목적이 아닌 순수 휴먼 원정길임을 내세우고 산악영화 특유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영화는 결코 8천 미터 고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대구 출신의 산악인 박무택을 연기한 정우의 연기만은 히말라야에 태극기를 꽂았다.
▲ 언제부턴지 우리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는 장면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먹는 장면이) 영화적 설정으로 꼭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영화 보고 나면 뜨끈한 라면 국물은 좀 땡긴다.
2015.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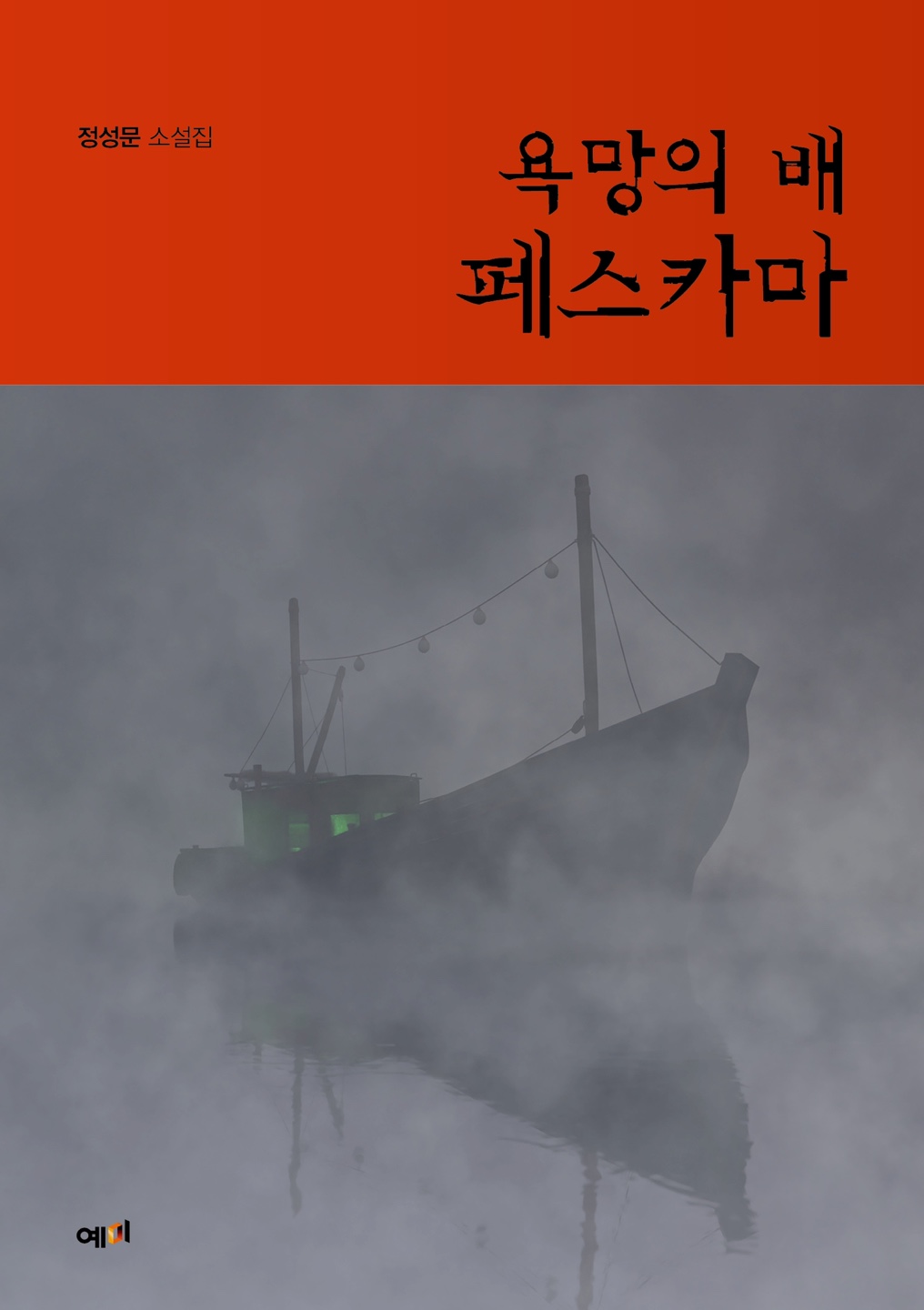

RECENT COMMENT